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미국과의 투자협정(BIT)을 추진했다. 하지만 한미 투자협정 협상은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스크린쿼터 폐지를 주장하는 미국의 요구와 국내 영화계의 반발이 부딪치면서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는 통상무역국가인 우리나라에게 스크린쿼터 문제는 협상의 아킬레스건이자 언젠가는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였다. 세계적으로 스크린쿼터 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국으로, 146일의 의무상영일수는 중국에 이은 세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스크린쿼터 제도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제법상 인정하고 있는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GATT 4조 d항은 스크린쿼터제가 자유화를 위한 협상의 대상이 된다는 점도 동시에 명시하고 있다.
물론 영화는 공산품과 달리 한 나라의 정신과 문화를 대표하는 산업이므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1998~99년 당시 국내의 여론도 스크린쿼터 유지를 지지했다.
한국영화 상영일수 170일, 이미 스크린쿼터 넘어서
2001년 이후 한국영화는 많은 변화를 겪으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1,000만 명 관객을 동원하는 초대형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속속 등장했고, 연이어 시장점유율은 50%에 넘어서고 있다. 영화를 볼 수 있는 인구 수를 감안했을 때 1,000만 명 관객 영화의 등장은 우리 국민에게 한국 영화가 생활의 일부가 됐음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크린쿼터 축소를 반대하는 측도 언제까지 스크린쿼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결국 언제 축소할 것이냐 하는 시기의 문제인데, 이는 1999년과 2000년 국회가 채택한 '스크린쿼터 유지 촉구 결의안'에서 단초를 찾을 수 있다.
당시 결의안은 한국영화 점유율이 40%를 넘을 때까지는 스크린쿼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같은 결의는 스크린쿼터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시된 것이지만 점유율 40%를 검토 기준으로 제시한 것만은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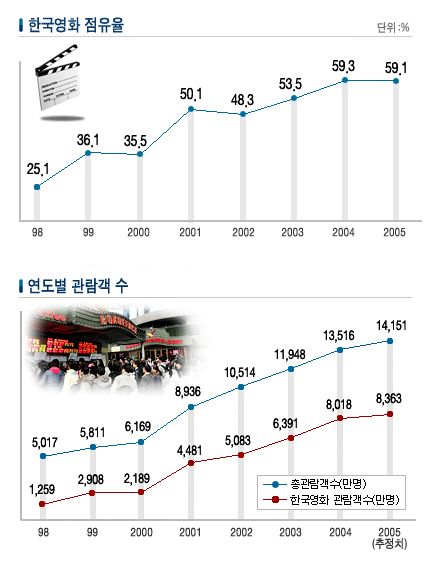 | | |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스크린쿼터를 검토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2001년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1999년과 2000년 한국영화 점유율은 각각 36.1%, 35.5% 수준이었으나 2001년 50.1%를 기록하더니 매년 성장을 거듭, 지난해는 59.1%까지 성장했다. 2002년(48.3%)을 제외하고는 매년 절반 이상의 스크린을 한국영화가 차지한 것이다.
특히 연간 한국영화 상영일수는 2004년 경우에는 170일에 달해 146일이라는 의무상영일수를 훌쩍 넘겼다.
또한 한국영화는 국내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수출에도 나서고 있다. 2004년 기준 한국 영화 수출액은 5,828만 달러로 2000년 705만 달러에 비해 8.3배나 규모가 커졌다.
블록버스터 영화들의 탄생은 막대한 자금을 영화산업으로 불러들였고, 제작과 배급, 투자 시스템은 선진화했다. 과거 국내 영화 산업이 주먹구구식이었다면 이제는 일정 규모를 갖춘 제작ㆍ투자사가 성공 여부를 철저히 따져 기획하고 합리적인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 해외영화제에서의 잇단 수상 소식은 한국영화가 질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스크린쿼터 FTA협상 가져가면 '독'이 될 수도
73일로의 스크린쿼터 축소가 한미FTA 협상 개시를 위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의 결정은 한국영화의 경쟁력이 이제 스크린 쿼터에만 머물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 일각에서는 한미FTA 협상 테이블에서 스크린쿼터 문제를 다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거 한미투자협정 당시 미국 측의 요구는 '축소'가 아닌 '폐지'였다는 현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외교통상부 이혜민 한미FTA기획단장은 <국정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미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했다고 이해하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스크린쿼터라는 카드가 FTA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에게 득이 될 지 장담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외교부 관계자는 "투자협정을 좌초시켰던 '뜨거운 감자' 스크린쿼터가 협상 과정에서 어떤 파장을 가져올 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며 "스크린쿼터 카드를 갖고 우리가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른 것을 내 주는 카드가 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우리 협상단은 현재 스크린쿼터를 유보안에 포함시켜 미국 측이 더 이상의 추가 축소 요구를 할 수 없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 대자본을 앞세운 헐리우드 영화와의 경쟁은 처음부터 무리라고 말한다. 물론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최근 국내 영화 시장의 동향을 잘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이 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드시 투입되는 자본의 양에 의해서만 영화의 성패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장동건, 이정재, 이미연 등 톱스타와 150억 원이라는 자본이 투입된 영화 '태풍'은 제작 단계부터 대박을 예감했으나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하는 420만 명 동원에 그쳤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독식은 없다
'실미도'가 한국형 블록버스터라고는 하나 '반지의 제왕'에 투입된 자본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이었다. 하지만 흥행 성적은 실미도의 완승으로 끝난 바 있다.
또 톱스타라고 할 수 없는 배우과 비교적 저예산으로 만들어진 '왕의 남자'의 1,000만 관객 돌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화려한 영상이나 스펙타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짜임새 있는 내용, 즉 콘텐츠가 흥행의 관건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막대한 자본으로 무장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가 시장을 독식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서 집계한 올 상반기 박스오피스 순위를 보더라도 '왕의 남자'와 '투사부일체'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헐리우드 영화 '미션임파서블3'와 '다빈치코드'는 그 뒤를 잇고 있다.
'실미도'나 '태극기 휘날리며', '왕의 남자'같은 영화가 1,000만 명이라는 초특급 흥행 성적을 거둔 것은 '우리 정서에 기반한,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는 헐리우드 영화와 한국 영화와의 경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스크린쿼터 축소를 반대하는 측은 영화 자체의 경쟁력도 그렇지만, 미국 영화 직배사들의 횡포를 우려하고 있다. 흥행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급 영화를 배급하면서 다른 영화들까지 '끼워팔기'하는 행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내 배급사가 직배사 압도, '끼워팔기' 현실성 떨어져
하지만 한국영화의 성장은 국내 배급사의 성장을 함께 가져왔다. 지난해 서울 기준 배급사 시장점유율을 보면 국내 배급사가 70%의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국내 메이저 배급사 두 곳이 서울 소재 극장 배급 점유율의 42%에 달하고 있다.
이미 국내 배급사의 영향력이 훨씬 더 막강해졌음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이제는 국내 배급사가 외국영화를 배급하거나, 직배사가 한국영화를 배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직배사가 배짱을 부릴 수 있는 블록버스터 영화의 수가 연간 수 편에 불과할 뿐 아니라, 달라진 배급 시장 구조와 관객 선호도를 감안했을 때 '끼워팔기' 우려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스크린쿼터 축소가 경쟁을 심화시키고 이른바 '돈 되는' 영화 제작에만 열을 올려 다양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정부의 향후 영화산업 지원책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4,000억 원의 한국영화발전기금을 통해 비주류 예술영화, 독립영화, 다큐멘터리 등의 제작을 지원하고, 현재 10여 개에 불과한 예술영화 전용관을 100개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국 영화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위하여 지혜 모을 때
이와 함께 저예산 영화 제작 전문투자 조합을 결성하는 한편, 해외진출 전략 센터와 해외 공동영화 제작 지원 등을 통해 시장 확대를 적극 도울 것이다.
재정 지원 외에도 제작ㆍ배급사와 극장 간 수익분배율 개선, 영화 제작 투자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등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영화 현장인력의 처우 개선과 재교육에도 발벗고 나설 계획이다.
정부 지원의 효과를 미심쩍게 생각하는 시각도 있을 것이나, 현재 한국영화 발전의 원동력에는 국민의 정부 시절 1,500억 원의 지원금이 하나의 밑거름이 됐음을 잊어선 안 된다. 하반기 한국영화 최대의 기대주로 꼽히는 영화 '괴물'의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한국영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많은 영화인들이 정부 지원으로 만들어진 '영화 아카데미' 출신이라는 점도 곱씹어볼 만 하다.
스크린쿼터가 한국 영화 발전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국영화의 경쟁력은 의무상영이라는 울타리를 낮추더라도 건재할 것임은 물론, 경쟁 속에서 더욱 튼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저력을 이미 갖췄다고 본다. 무엇보다 '우리 정서에 기반한, 우리의 영화'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응원군, 우리 관객들이 있다. 이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위해 힘을 모을 때이다. |